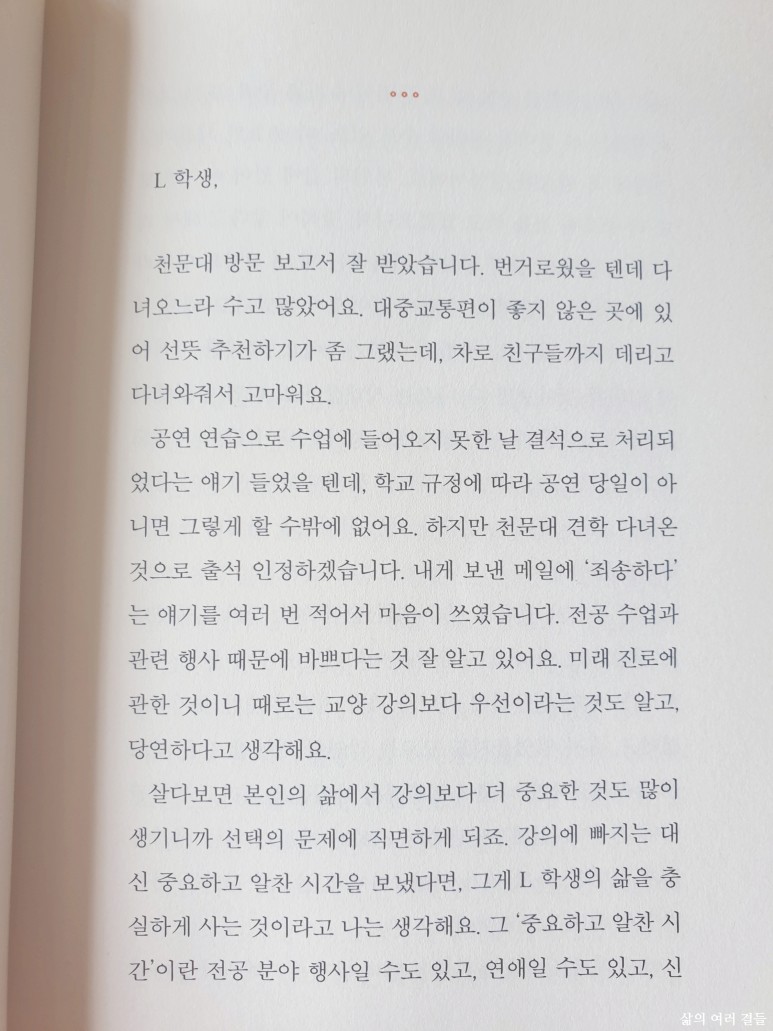
우주에 대한 사랑을 담았지만 결코 딱딱하거나 어려운 에세이는 아니다. 저자는 천문학자가 되기까지의 첫 출발점으로 학창시절 지구과학 수업 이야기를 꺼낸다. 평소 재미도 없고 친하지도 않던 선생님이 몸을 움츠려 아무도 볼 수 없게 한 채 점 2개를 칠판에 눌러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돌아봤다는 것이다. 무미건조한 중년 아저씨의 눈에서 반짝반짝 소년이 스쳤고 저자는 왜 연주 시간 등이 그 사람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지 무척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후 저자는 외롭고 흥미로운 길을 걸었다.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토성 위성인 타이탄을 전공했고, 이후에는 달에 관심을 가지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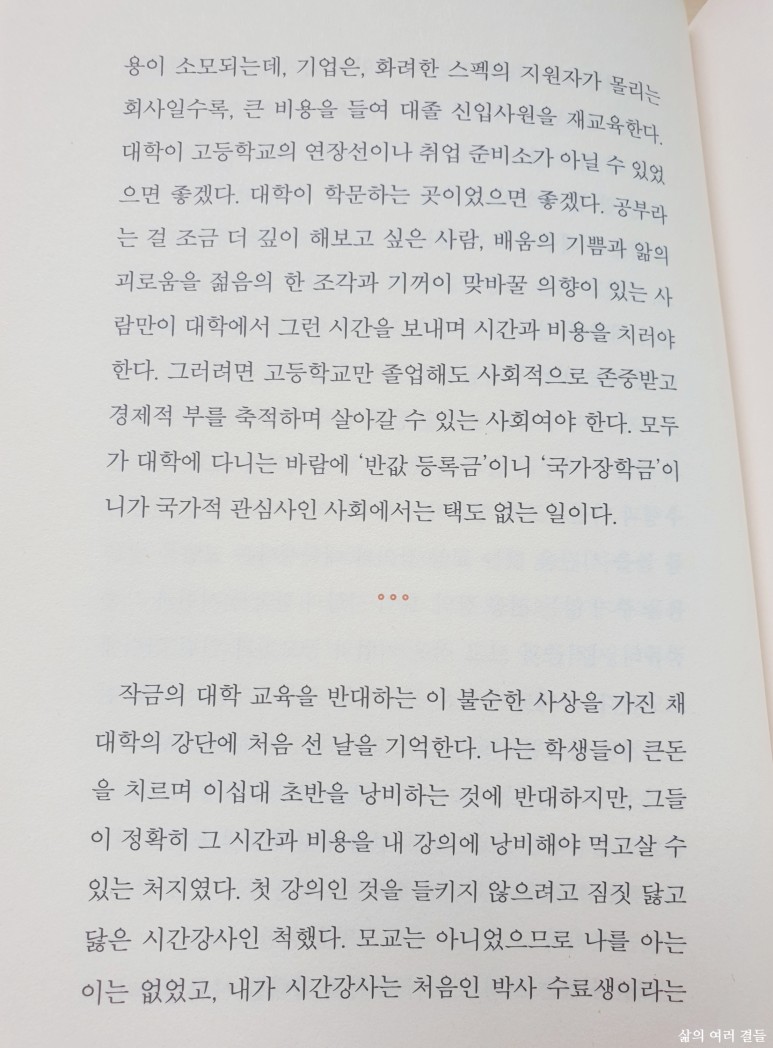

박사 졸업장을 운전면허증에 비유해 박사=연구면허일 뿐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아 연구자금 주위를 배회해 본 사람으로서 대학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목소리를 더한다. 저자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글쓰기 형식까지 가르쳐야 했다지만, 성인이 돼버렸지만 실상은 유예된 청소년일 뿐인 사람들의 말을 듣자 이들이 어떤 바람직한 대학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보다는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더 고민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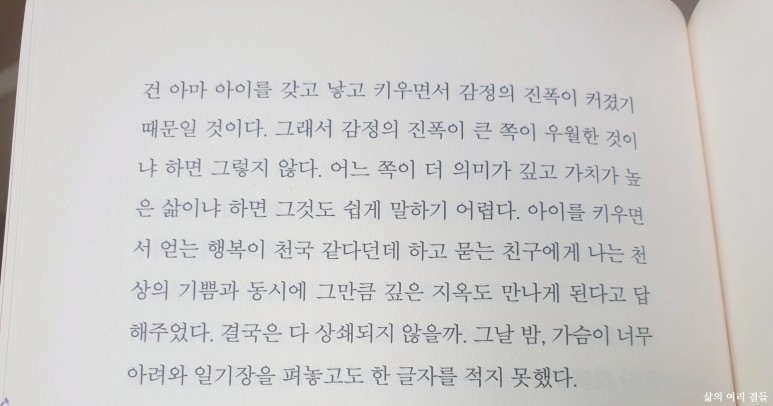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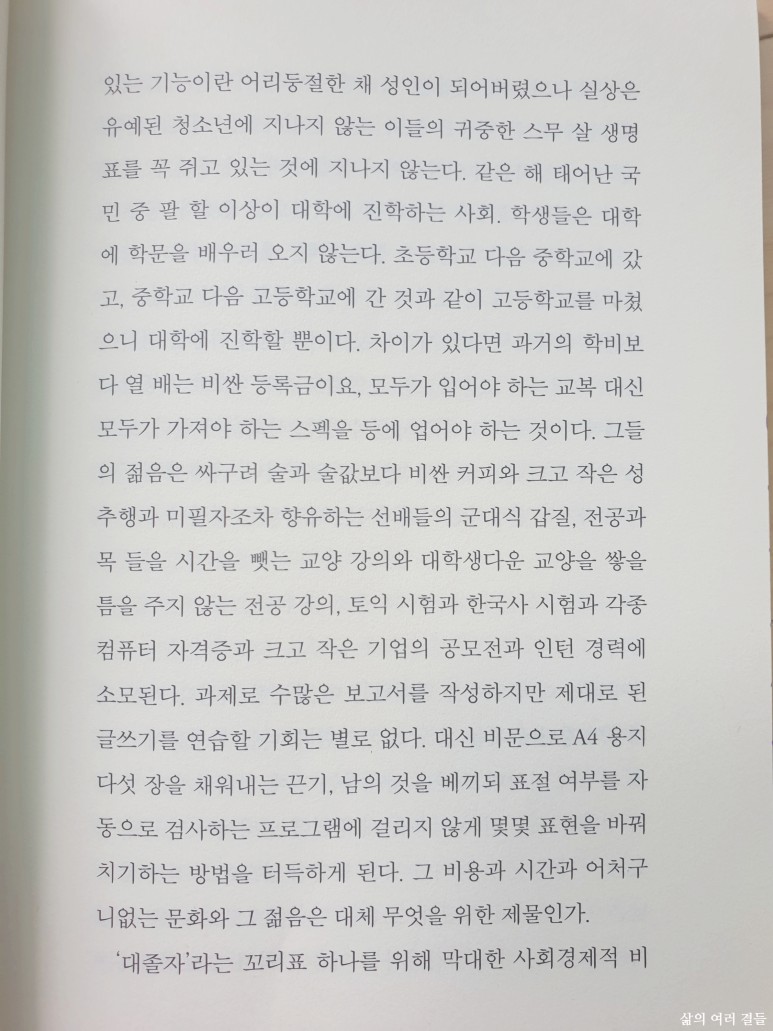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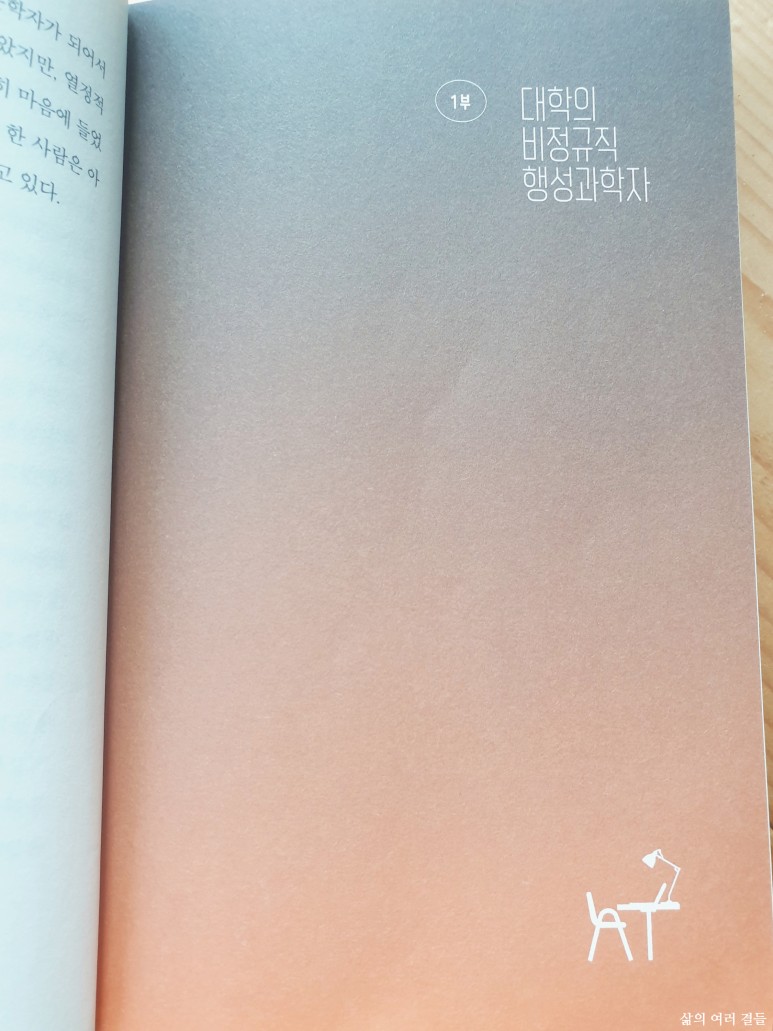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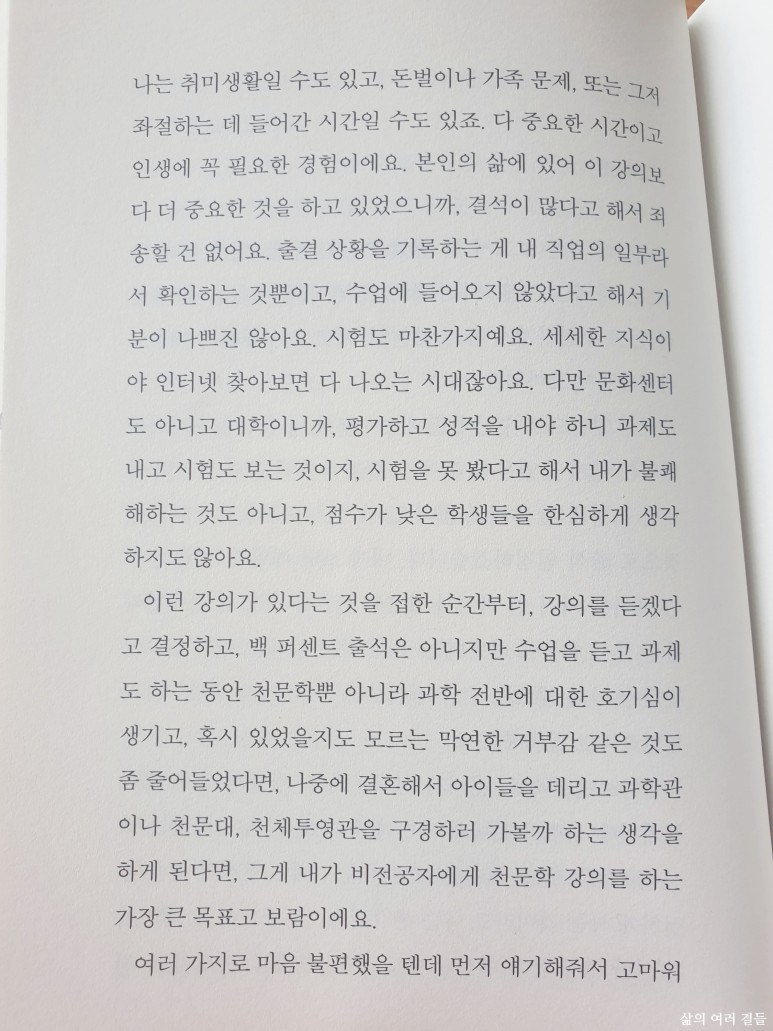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에 들어가서는 박사든 교수든 모두가 생계를 꾸려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 참여하는 연구과제가 있느냐에 따라 고용상태가 달라지고 과제가 끝나면 계약직 연구원 자신의 고용기간도 끝난다는 얘기는 왠지 낯익은 목격담이었다. ‘학술연구교수’라는 직급 이름 해석을 해보면 “호봉이 높은 박사 후 연구원, 연차나 경험은 좀 더 많지만 비정규직 연구전담 인력이긴 마찬가지”라고 한 부분과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의심이 많다는 얘기에 조금 웃기도 했다. 현실이 너무 심하게 반영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 얘기를 꺼내서 뭐라고 박사에게 동지애를 느끼게 해주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 아이를 이렇게 잘 돌본다고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자신의 입지를 낮추지도 않아서 좋았다. 이소연의 인터뷰와 관련해 여성에게만 들이대는 사회의 과도한 잣대를 비판할 때는 그 글을 통째로 옮겨 이성적 논리적이라고 자부하는 누군가에게 들이대고 싶었다.
반면 과학이란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 천재적인 과학자가 어디서 폴짝폴짝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이다(p.146). 저자는 천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우주를 사랑할 수 있고 우주를 사랑하려면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기술을 개발해 우주탐사를 기꺼이 뒷받침하고 싶다.